쓰고 또 쓰라... 시는 온몸이요 목숨이니
시에도 마성이 있다면, 그걸 일러 시마(詩魔)라 할 것이다. 안도현 시인의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는 30년 동안 시마와 동숙한 자가 체험으로 터득해 쓴 ‘시마 길들이는 법’이다. 시마의 습격을 받고 시마의 횡포에 시달린 자의 육성 고백이다. 그 시달림에는 기이하고도 특별한 쾌락이 함께했으니, 그의 고백은 시마와 교접하여 절정을 만끽한 자가 내뱉는 탄성의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섯 달 동안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 속에 <한겨레>에 연재된 글들이 더 많은 전거와 예증의 살을 입고 책으로 나왔다.
안도현 시인 살갑고 생생한 ‘시 작법’
“많이 겪고 읽고 상투성 처단하라”
김수영·롤랑바르트 등 1급 작가 글에
한자 문화권 시학도 동원 ‘육성 고백’
이 책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시작법이고 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론이다. 그러나 외국의 이론을 빌려다 모호한 개념으로 채운 통상의 시론서와는 아주 다르다. 지은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시대 시인들의 시가 사례가 되고 그들의 체험이 바탕을 이룬다. 우리 고전을 빛냈던 1급 문장가들의 글을 앞세우고 한자 문화권의 시학을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이 책은 추상적 이론세계가 아닌 체험적 생활세계에서 추출된 시론이 되고 그 시론의 뒷받침을 받는 시작법이 됐다. 이렇게 살갑고도 생생한 말로써 지은이는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 감별하는 법을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시와 친해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 책은 시작법 안내서다. 좋은 시를 쓰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스물여섯 꼭지에 나뉘어 실렸다. 그 스물여섯 꼭지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대로 아름다운 시 한 편의 탄생기를 이룬다.
시를 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지은이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겪음’이다. 많이 겪어라. 많이 만나고 많이 마시고 많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겪음은 읽기, 곧 글을 통한 겪음으로 수렴한다. “시 한 줄을 쓰기 전에 백 줄을 읽어라.” 시쓰기도 다른 모든 일과 다르지 않아서, 먼저 학습이다. “시집을 백 권 읽은 사람, 열 권 읽은 사람,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 중에 시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학습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모방이다.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시적 영감이 번개치듯 심장으로 날아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차라리 흠모하는 시인의 시를 한 줄이라도 더 읽어라.” 모방을 잘하려면 ‘지독히 짝사랑하는 시인’을 얻어야 한다. 혹독한 짝사랑의 열병에 걸려 시인의 말투며 표정까지 베끼고 외울 때, 그 끝에서 창조의 꽃봉오리가 가까스로 열린다.
시쓰기는 몰입이고 열정이다. 지은이는 천재시인이란 없다고, 천재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의 다른 말이라고 말한다. 이광웅 시인이 <목숨을 걸고>라는 시에서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을 지은이는 상기시킨다. 이 목숨 거는 자세가 열정이고 그 열정의 흐름이 몰입이다. 시는 몰입의 산물이며 열정의 열매다. “열정의 노예가 되어 열정에 복무할 때” 거기서 시적 재능이 비로소 싹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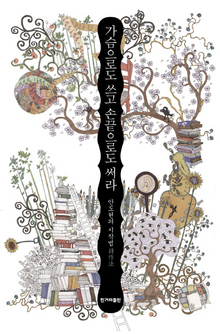 | |
시인에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상투성이다. 지은이는 롤랑 바르트의 말을 빌려 상투성이란 “어떤 마력도 어떤 열광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지적한다. 상투성이라는 적을 제압한 자만이 시인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 입장권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자는 이 세상을 낯설게 보아야 한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발견해야 한다. 세계와 불화해야 한다. 이문재 시인이 스무 살 시절에 “우리에게는 파격이 필요했다”고 털어놓은 것은 일상이 전쟁터였음을 증언하는 말이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불렀고, 본관 앞에서 막걸리에 도시락을 말아 먹었다. 글씨를 왼손으로 썼고, 담뱃갑을 거꾸로 뜯었다.”
상투성과 싸우는 자는 관념어와 싸우는 자이기도 하다. 시의 나라에서 관념어는 죽은 말이다. 말의 주검에서는 삶이 나올 수 없다. 시는 몸을, 육질을 더듬고 탐하는 일이지, 추상세계를 고공비행하는 일이 아니다. 죽은 언어는 죽은 인식을 낳고, 진부한 말은 진부한 생각을 만든다. ‘애수’(유치환)도 ‘애증’(박인환)도 ‘견고한 고독’(김현승)도 시의 세계에선 사어다. “시간의 무덤에서 하얗게 풍화된 죽은 말들이다.” 그러므로 지은이는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개념으로 말하는 순간 지겨워진다. 당신의 습작노트를 수색해 관념어를 색출하라.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여 처단하라. 암세포와 같은 관념어를 죽이지 않으면 시가 병들어 죽는다.”
관념어만 시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시는 감정의 과잉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지은이는 말한다. “감정을 쏟아붓지 말고 감정을 묘사하라.” 감정의 홍수가 넘실대는 곳이야말로 시의 금지구역이다. 넘쳐 흐르는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시가 아니다. 차라리 시는 감정의 홍수에 떠밀려 익사 직전에 이른 자의 그 위태로움을 냉정하게 묘사하는 일이다. 지은이는 가차 없이 말한다. “제발 시를 쓸 때만 그리운 척하지 마라. 혼자서 외로운 척하지 마라. 당신만 아름다운 것을 다 본 척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척하지 마라. 유식한 척하지 마라.” 이 ‘척’이야말로 시의 독이다.
과잉 감정은 가짜 감정이다. 시쓰기는 가짜를, 껍데기를 뚫고 진짜 속으로,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시는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쓴다. 그러나 시는 가슴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손끝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다. 지은이는 여기서 김수영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를 불러들인다. “시작(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어 마침내 만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김수영은 말한다. 지은이는 이 온몸의 시학, 온몸의 사랑을 두고 “시를 창작하는 일은 온몸으로 하는 반성의 과정이며, 현재형의 사랑이며 고투”라고 다시 새긴다. 이 온몸의 사랑에서 시가 태어난다. 그렇다면 시의 세계는 삶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시는 삶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아, 당신도 시를 쓰라.” (한겨레)
'시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주 붉은 현기증(천수호) /책 중에서 (0) | 2009.05.19 |
|---|---|
|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쓰라 (안도현) (0) | 2009.03.19 |
| 우리 말 (0) | 2009.03.06 |
| 시의 이론 (문학상식) (0) | 2009.02.25 |
| 시가 흐른다 (창작론) (0) | 2009.02.25 |